0.001초 가르는 빙판 위, 최대 변수는 ‘얼음’
韓, 쇼트트랙 메달 사냥에 ‘경계령’
“얼음이 물러” 선수들 한목소리
조직위 “문제없다” 일축

[스포츠서울 | 밀라노=김민규 기자]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가르는 소리보다, 선수들의 깊은 한숨이 먼저 들려온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메달 레이스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경쟁 상대가 아니다. ‘빙질’이다.
남자 대표팀 막내 임종언(19·고양시청)은 11일(이상 한국시간) 공식 훈련을 마친 후 “연습할 때보다 본 경기 대 빙질이 안 좋은 게 느껴졌다. 얼음이 물러서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 넘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빙질이 무르면 날이 깊게 박히지 않는다. 활주가 둔해지고, 속도를 올릴수록 균형 잡기가 어렵다. 더욱이 0.001초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쇼트트랙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여자 대표팀 김길리(22·성남시청)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혼성계주 때 선수들이 많이 넘어지더라. 코너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서 넘어져 너무 속상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실제로 연쇄 낙상이 이어졌다. 미국의 코린 스토다드는 2000m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코너를 빠져나오다 미끄러져 김길리와 충돌했다. 네덜란드의 산드라 벨제부르도 같은 종목에서 넘어지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태극전사들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 쇼트트랙 ‘최강자’로 꼽히는 캐나다의 윌리엄 단지누는 “얼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했고, 네덜란드의 젠스 반트 바우트도 “빙질이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는 쇼트트랙과 피켜 스케이팅이 함께 열린다. 문제는 얼음 두께다.
국내 빙상계 관계자는 “피겨는 착지를 위해 얼음을 약 3㎝로 비교적 얇고 무르게 만든다. 반면 쇼트트랙은 5㎝ 정도로 두껍고 단단해야 한다”며 “얇은 얼음은 활도가 떨어지고, 중심 잡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쇼트트랙과 피켜 스케이팅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 열리는 일정이다. 빙질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회 조직위원회는 “문제없다”고 선을 긋는다. 루카 카사사 조직위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빙질 문제를 제기한 선수는 소수이며, 경기 내내 아이스 메이커가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빙질 관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조직위 입장이 아니라 선수들의 목소리다. 올림픽의 신뢰가 어설픈 ‘빙질 관리’로 인해 훼손될 수도 있다.

쇼트트랙은 흐름의 경기라고 한다. 빙질이 안 좋으면 전략도 흔들릴 수 있다. 선수들은 코너 진입 시 평소보다 더 조심하고, 공격적인 아웃코스 추월을 망설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목표로 한다. 여자 500m, 1500m, 남자 1000m와 1500m, 계주까지 메달 가능 종목이 즐비하다. 0.001초를 다투는 경기에서 날카로운 스케이트보다 더 예민한 건 얼음 상태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은 이제 상대뿐 아니라 얼음과도 싸워야 한다. kmg@sportsseoul.com







![‘비상’ 쓰러진 김길리 갈비뼈 통증…최민정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지 않다, 마음 추스르길” [2026 밀라노]](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10/rcv.YNA.20260210.PYH2026021026080001300_T1.jpg)
![[단독]‘세리머니 사과’ 이청용, 은퇴 기로서 ‘승격팀’ 인천 전격 입단…백의종군 심정, 윤정환 품에 안긴다](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10/news-p.v1.20251030.43392069290b48a5aea89d8bd1254676_T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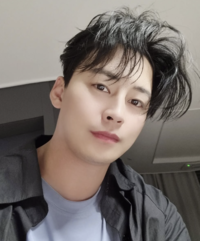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금지된 사랑을 그리워하는가 ‘사의 찬미’…그 시작과 끝은 ‘이것’이었다](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8/58867f53-7347-46d3-8e67-dd34b098c539.jpg)
![설원 위 ‘미친 폼(Crazy Form)’, BMW i4 M50의 침묵 속 질주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507/aec041e3-98f5-4d0a-8462-342e53d0e55e.jpg)
![엄마는 서울대, 아빠는 방송인…신동엽 딸, 재능의 출처는 [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d0c372a5-4897-4f59-a2c2-b418e0a77ae9.jpeg)

![“캠프서 3000개는 던져야” 김성근·선동열의 재림, 트렌드라고? [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496a2f67-8246-4727-b4f6-fde5985b20cf.jpg)
![핸들을 놓거나, 혹은 잡거나…괌을 여행하는 두 가지 ‘속도’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507/e53f451a-06e2-4ba0-9e6a-b9d0a609af61.jpg)
![‘한화→대표팀’ 계속 시끌시끌…이제 김서현에 그만 ‘매몰’됩시다 [김동영의 시선]](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df89794b-229a-4cf7-92bc-5fafb2ea18fa.jpg)
![‘프로게이머’는 그만…이제 ‘프로 e스포츠 선수’라 부를 때다 [김민규의 e시각]](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88018f7a-a412-4750-b8ad-9f1915af98f2.jpg)
![부드러운 강력함, BMW 550e…고성능 PHEV의 정수[배우근의 생활형시승기]](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1/c8f23327-96f7-4d48-a157-3fba7f049636.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관객 참여형 뮤지컬 ‘리딩 쇼케이스’, 경쟁력 살아있네!](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12/792903aa-f247-4ab1-8fbc-7a78ba8619be.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금지된 사랑을 그리워하는가 ‘사의 찬미’…그 시작과 끝은 ‘이것’이었다](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10/news-p.v1.20260210.3826a1eca07348388ab90a7be35aba26_T1.jpg)
![설원 위 ‘미친 폼(Crazy Form)’, BMW i4 M50의 침묵 속 질주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08/news-p.v1.20260208.c44d88ba11c24ef186309046063ac121_T1.jpg)
![엄마는 서울대, 아빠는 방송인…신동엽 딸, 재능의 출처는 [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05/news-p.v1.20260205.debfb7c42e8648149ac3537f3863e066_T1.png)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올림픽은 ‘찬밥’…JTBC 독점과 무지한 체육행정[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03/rcv.YNA.20260121.PYH2026012108400001300_T1.jpg)
![메달로 답했는데 ‘먹튀’ 낙인…中애국주의 논란에 억울한(?) 구아이링[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03/news-p.v1.20260203.3daf9cad310a4ab8a1761b57e14aa58b_T1.jpg)
![“캠프서 3000개는 던져야” 김성근·선동열의 재림, 트렌드라고? [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02/news-p.v1.20260202.2a9f62d448b94ba4b3ac95f4be31be2b_T1.jpg)
![“아파트, 아파트~” 500km 달려도 거뜬한 ‘국민차’…로제 ‘APT.’ X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31/news-p.v1.20260131.7c9a2f484c6642d4aa610ee13751ef56_T1.pn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장르의 새로운 공식…언어로 무대화한 매혹적인 퍼포먼스](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9/news-p.v1.20260129.392a3c415d034578b35a3c4e390213ef_T1.jpg)
![렉서스 LM500h가 선사하는 ‘밤의 유영’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8/news-p.v1.20260128.bc81a1cc545947779711745c37dab4d5_T1.jpg)
![폭스바겐 투아렉과 엑소(EXO)의 ‘으르렁’, 도로를 지배하는 야수의 본능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8/news-p.v1.20260121.3b4916907bda408ca60bf314625fbe68_T1.jpg)
![미아 위기 FA 손아섭 최저연봉 3000만원 파격 역제안, 안되나?[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7/news-p.v1.20251101.e9d756e4c1434a3e815d1afe515c6837_T1.jpeg)
![“감각으로 가르치면 다 도망가요” 최강록 셰프 푸념, 어째 KBO리그 스프링캠프 같네 [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1/news-p.v1.20250302.c20de051663143b6b327ab83c1bf0068_T1.jpg)
![KBO 아마야구 ‘생태계 교란종’ 전락? 고교 선수 빼가거나 보내거나 [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9/news-p.v1.20260113.5cbe22767e0b4a9781d22b9e7ff82c08_T1.jpg)
![싼타페, 진중함 속에 숨겨진 ‘칼군무’ 같은 디테일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3/news-p.v1.20260117.73075b56ae8842c3954ce5189538f963_T1.jpg)
![설원 위 ‘첫사랑’ 같은 떨림…볼보 EX30 CC와 함께한 ‘Love 119’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6/news-p.v1.20260117.42f0d9b6b18944fdad628d610cc21e7b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은 ‘팬레터’…다시 찾아온 ‘봄의 노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5/news-p.v1.20260115.3f4fedafbbb042a28af204cbd8ef2300_T1.jpg)
![“난 앞만 보고 달려”…설원(雪原)을 찢는 두 개의 심장 ‘질주’, 람보르기니 우루스 SE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7/news-p.v1.20260114.ccef9acd8a3347cbb1e76f4ecda569fe_T1.jpg)
![다니엘의 ‘소통과 포석’…431억 소송前 첫 수읽기[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3/news-p.v1.20260113.ed0686c45f074955bfa3132066ef0e14_T1.jpg)
![핸들을 놓거나, 혹은 잡거나…괌을 여행하는 두 가지 ‘속도’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5/news-p.v1.20260110.5fc5660da4ef4a2e94b612ca7c576fd8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