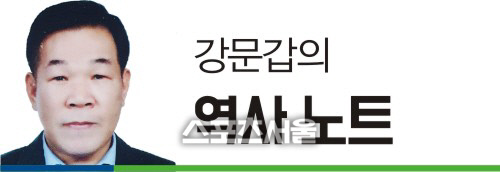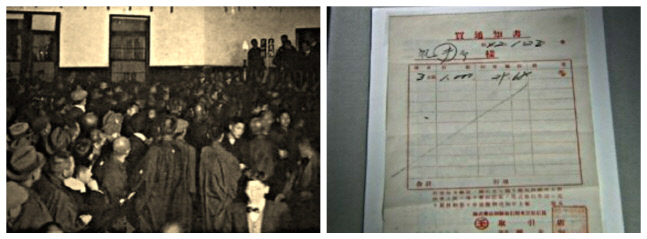|
[스포츠서울] 1차 세계 대전에서 승전국이 된 일본은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농촌의 생산인구는 도시로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의 쌀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18년 7월, 도야마 현의 우오즈(魚津) 항에서 폭동이 일어나 전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에 자국의 쌀 수급난을 간파하고 조선 쌀 시장을 주목한 것은 일본 상인들이었다.
인천은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원산에 이어 3번째로 1883년 개항했다. 개항 이후 제물포항 객주들이 각지에서 실려 오는 미곡의 집산을 도맡아 오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자유롭게 통상하고 거주할 수 있는 치외법권 구역인 조계가 일본을 시작으로 설치되면서, 일본 상인들은 미곡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미두취인소를 1896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군산 등에 개설하였다.
미두취인소는 쌀가격 안정과 품질의 표준을 만들고, 조일 무역을 증대시킨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쌀 가격 등락을 통한 시세차익과 지주제를 통해 생산된 조선 미곡을 일본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로써 일본의 미곡 수탈은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
미두취인소는 쌀(米)과 콩(豆)을 거래한다고 해서 미두장(米豆場)이라 하였고, 기간을 두고 쌀을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해서 기미(期米)시장으로도 불리었다. 물량을 외치고 손가락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사람을 바다지(場立), 체결 가격을 기록하는 서기를 다카바(高場), 시세를 외치는 사람을 요비코(呼子), 장외 투기꾼을 하바꾼(合百), 소액 투자자는 마바라(잔챙이)라 하였다.
미두장은 하루에 17절씩 열렸는데 오전에 열리는 전장(前場)에서 10절이 열렸고, 오후에 열리는 후장(後場)에서 7절이 열렸다. 절이란 쌀의 가격을 공시해서 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보통 선물 거래기간은 3개월이다. 1월에 쌀 1석을 35원에 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3월에 가격이 45원으로 오르면 오른 차액 10원 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로, 100석, 1000석 거래규모를 감안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바다지는 돌아서면서 엄지 식지 중지 세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쳐들고 “고햐쿠(五百) 야로~” 소리를 친다. 이것은 8전에 500석을 팔겠다는 뜻인데, 그 소리가 떨어지자 장내는 더럭 흥분이 된다. 여기저기서 ‘얏다(판다)’, ‘돗다(산다)’ 소리와 동시에 팔이 쑥쑥 올라오고, 소리는 한데 엉켜 왕왕거리는 아우성 소리로 변한다.”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미두취인소의 내부를 묘사한 채만식(1902~1950)의 소설 ‘탁류’의 한 장면이다.
|
1920년 1월, 몇 달 동안 지루한 보합세를 이어가던 쌀값이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두의 신으로 불렸던 반복창(1900~1940)이 한 섬에 55원씩 1만 섬을 사서 73원씩에 팔아 한 번 거래로 18만원(180억원)을 벌었다. 밑천 400원으로 시작한 반복창의 재산은 40만원(현재 시세 약 400억원)으로 1000배나 늘어났다.
반복창이 미두로 1년 만에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번지자 인근 서울 경기 지역뿐 아니라 중소도시 지주, 소자본가까지 미두취인소로 몰리면서 취인소 앞은 연일 장사진을 이루었고, 인천항 일대는 전답을 판 돈을 당나귀에 싣고 온 투기꾼으로 넘쳐났다. 당시 인천의 궁정동(신생동) 유흥가는 미두꾼들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1920년대 정점에 올랐던 미두열풍은 하층민에게 까지 번졌다. “화투는 백석지기 노름이요. 미두는 만석지기 노름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미두장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미두취인소 근처에서 시세의 오르내림에 푼돈을 걸고 하던 사설 도박인 합백(合百:절치기)에 빠져들었다. 이들 역시 무모한 투기의 희생자였다.
조선에서 생산한 쌀의 일본으로 유출되는 양은 1920년 14.7% 이었지만, 1926년에는 42.9%로 절반 가량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조선인들이 미두취인소에 바친 돈은 수억원(현재 가치 수조원)에 달했다. ‘땅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현금은 미두취인소로’ 수탈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두장은 조선 농민의 몰락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1931년 일제는 ‘조선취인소령’의 시행으로 인천 미두취인소는 당시 주식시장이었던 ‘경성주식현물취인시장’과 합병되어 조선취인소 기미부가 되었으며, 더욱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쌀과 주식 투기에 나섰다. 1939년 11월, 인천 미두판의 황금몽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구름처럼 흩어졌다며 조선인들을 폐인으로 만들었던 미두취인소의 폐쇄소식을 전했다.
<역사 저널리스트>





![父 이름 쓴 조진웅, 강도 강간 등 소년범 의혹…“사실관계 확인중” [공식입장]](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5/news-p.v1.20241118.57b92e23e3ee43578f14a74b430d31f8_T1.jpeg)

![‘소년범 인정’ 조진웅, 전격 은퇴 선언 “배우 인생 마침표 찍겠다” [공식입장]](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6/news-p.v1.20251206.2799739314164ac9af9275895a10c12f_T1.jpg)
![박나래, 안주 심부름·음주 강요 등 갑질 의혹으로 피소…“확인중” [공식입장]](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4/news-p.v1.20250915.22739b9c56fd485d9909d3f9cf34d99d_T1.jpg)
![‘극장X야구 컬래버’ 色다른 시상식 열렸다, 팬과 함께한 ‘축제’ [올해의 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4/news-p.v1.20251204.a3d3d34cbb9c441c8ae2fcb77069fd27_T1.jpg)
![“미국서 韓 야구 많이 봐…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열기 이어지길” 특별상 김혜성 [올해의 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4/news-p.v1.20251204.334b6e291ee2421ab63b0158cadb6af0_T1.jpg)
![박나래 측 “前 매니저들 허위 주장·수억원 요구, 정신적 충격” [공식입장 전문]](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5/news-p.v1.20250915.22739b9c56fd485d9909d3f9cf34d99d_T1.jpg)
![서울大 경영 택한 이부진 아들…이상한건 한국의 ‘의대집착’[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d0c372a5-4897-4f59-a2c2-b418e0a77ae9.jpeg)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 “검은 흙먼지 걷고 ‘2.5조 빅뱅’ 쏘다”…강원랜드, 오사카 넘을 ‘K-리조트’의 대반격](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507/e53f451a-06e2-4ba0-9e6a-b9d0a609af6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 희생으로 완성한 역사…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8/58867f53-7347-46d3-8e67-dd34b098c539.jpg)
![검사(檢査) 받는 KBO, 이 참에 정치-스포츠 절연해야[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496a2f67-8246-4727-b4f6-fde5985b20cf.jpg)
![‘한화→대표팀’ 계속 시끌시끌…이제 김서현에 그만 ‘매몰’됩시다 [김동영의 시선]](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df89794b-229a-4cf7-92bc-5fafb2ea18fa.jpg)
![‘프로게이머’는 그만…이제 ‘프로 e스포츠 선수’라 부를 때다 [김민규의 e시각]](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88018f7a-a412-4750-b8ad-9f1915af98f2.jpg)
![메이저리거 김하성, 올리브 패딩으로 완성한 겨울 스트릿 룩! [이주상의 e파인더]](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503/fe6a08ea-7f72-4cdb-a416-b9c23cacb661.jpg)
![부드러운 강력함, BMW 550e…고성능 PHEV의 정수[배우근의 생활형시승기]](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1/c8f23327-96f7-4d48-a157-3fba7f049636.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관객 참여형 뮤지컬 ‘리딩 쇼케이스’, 경쟁력 살아있네!](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12/792903aa-f247-4ab1-8fbc-7a78ba8619be.jpg)
![서울大 경영 택한 이부진 아들…이상한건 한국의 ‘의대집착’[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5/rcv.YNA.20231113.PYH2023111304990001300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 희생으로 완성한 역사…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1/news-p.v1.20251201.153ccb2b098b41ba80ab8b1deafd2b7b_T1.jpg)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 “검은 흙먼지 걷고 ‘2.5조 빅뱅’ 쏘다”…강원랜드, 오사카 넘을 ‘K-리조트’의 대반격](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2/news-p.v1.20251127.97ad4e79fd2d4eca9e7ebdc7918bb8b8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뮤지컬 ‘에비타’, 아르헨티나가 여전히 그리워하는 ‘민중의 성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23/news-p.v1.20251123.203766df5b7e4a7f9a527eb1f6c17dfe_T1.jpg)
![김연경 프로젝트, 예능 넘어 배구계 향한 승부수 [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8/news-p.v1.20250924.517fd1fa8f6541a8ad2a1eec07bb813d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산타클로스 선물 같은 뮤지컬 ‘렌트’, 사랑한다면 지금 고백하세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7/news-p.v1.20251117.f21bdbe93fe148c5995a3f38d2a0b60a_T1.jpeg)
![검사(檢査) 받는 KBO, 이 참에 정치-스포츠 절연해야[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3/news-p.v1.20250728.f9bb242e2c82472fa8d612505912c2dc_T1.jpg)
![‘한화→대표팀’ 계속 시끌시끌…이제 김서현에 그만 ‘매몰’됩시다 [김동영의 시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2/news-p.v1.20251109.4ae0b9b222f643318113e0a44330694a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연극‘아마데우스’, 아름다움을 시기·질투 그리고 탐욕스러운 대가…그 끝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2/news-p.v1.20251112.8877cc152a7840e98ba4dd0a2af8917c_T1.jpg)
![‘프로게이머’는 그만…이제 ‘프로 e스포츠 선수’라 부를 때다 [김민규의 e시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1/news-p.v1.20251110.4e944a9ed7b6439a8f6520d6aadba4f6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뉴 캐스트의 발견 뮤지컬 ‘데스노트’, 21세기 ‘선악과의 유혹’이 시작된다](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0/news-p.v1.20251110.567bb0e84eb8420c882e267580557d3d_T1.jpg)
![‘뉴진스는 어디에’…올드진스 되어가는 다섯소녀의 잃어버린 시간 [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09/news-p.v1.20250110.3ea142b2edd04106acbab760db7b2fa0_T1.jpg)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418홈런 타자, ‘코치 해줘서’ 고맙습니다 [김동영의 시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05/news-p.v1.20240529.776d1202158b4b339a1f70fad8e3d720_T1.jpg)
![문가비子 사진공개, 갑론을박할 문제인가?…댓글 OFF 전환[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03/news-p.v1.20251102.49b9e2ca456748bf8faf32bae4427aad_T1.jpg)
![메이저리거 김하성, 올리브 패딩으로 완성한 겨울 스트릿 룩! [이주상의 e파인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03/news-p.v1.20251101.3aa8b5ac67c34f12a09d494d86ad5ce5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사랑은 ‘날씨’처럼 변하는 것…뮤지컬 ‘레드북’, 나를 찾는 탐험 같은 ‘어른이 동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31/news-p.v1.20251031.fc8162ee336d4f2087ea7b7354537b26_T1.jpg)
![세 번의 비행, 한 번의 보트…고단함 끝에 만난 어른들의 낙원, 로빈슨 클럽 몰디브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29/news-p.v1.20251019.ffed48b43e9741e09e5b1158d87b4b60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한시도 눈 뗄 수 없는 다이내믹 체인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27/news-p.v1.20251027.362d1b48c56e441f94baff25034eb235_T1.jpe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새로운 재미를 찾고 있다면? 태양의 서커스 ‘쿠자’,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25/news-p.v1.20251025.c3efd4f340bc4de4b3521dc45d5d3711_T1.jpg)
![‘성인입양’ 혈연보다 마음이 먼저, 진태현·박시은 가족 [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22/news-p.v1.20251022.639795b37ad1439eac4317f1f9503b2d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