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KBO리그 구단도 돈을 벌어야 한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얘기는 2000년대 들어 매년 화두로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정운찬 총재가 취임한 2018년에는 KBO리그 산업화를 최대 과제로 선언하기까지 했다.
산업화 기치를 내건 지 5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코로나로 2년간 사실상 구단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는 것을 고려해도 산업화에 대한 구단간 시각차는 여전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양질의 팬서비스를 위해 트래킹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하려는 것도 구단에 비용절감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덕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외 통합 마케팅은 논의만 하고 있을 뿐 진전이 없다.
|
올해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 덕분에 관중석을 100% 개방했다. 관중 수익은 구단의 주 수입원이라 코로나로 조였던 숨통이 조금은 트였다. 야구 열기가 코로나 이전만 못한다고는 하나, 취식과 육성응원을 허용하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치열한 순위싸움과 함께 구름관중이 몰려들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나오고 있다.
관중이 모이면 구단은 계산기를 두드린다. 관중수익의 75%를 홈구단이 갖고, 25%를 원정팀이 갖는 구조다. 잠실구장을 함께 쓰는 두산과 LG는 양팀 맞대결 때 홈팀이 입장수익의 100%를 모두 갖는 것으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전 구단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수도권 팀은 관중수익을 홈구단이 모두 가져가는 데 적극 찬성이다.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롯데 KIA 등 ‘전국구 인기구단’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팬이 모인다. KIA 양현종은 2017년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잠실도 우리 홈 같다”고 말해 홈팬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수원, 인천, 서울 고척스카이돔도 ‘잘나가는 KIA 롯데’가 상경하면 매진사례를 기록한다. KT는 창단 초기 “KIA 롯데 한화 등 원정팀 팬이 먹여 살렸다”는 ‘웃픈’ 농담을 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 ‘홈 팀이 관중수익 100%를 모두 가져가자’고 주장하면, 지방 인기구단은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
|
최근에는 그룹 계열사에 판매한 스카이박스, 일부 지정석 등을 관중수익이 아닌 마케팅 수익으로 책정한 구단이 있다고 한다. 관중 수에는 포함하지만 입장수익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원정팀이 가져가는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종의 꼼수다. 관중 수는 부풀리고 입장수익은 축소하니, 평균 객단가를 중심으로 가치평가를 하면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대다수 구단이 경기 관중 수를 부를 때 시즌권 구매자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통합 마케팅의 출발은 ‘공동생산 공동분배’다. 자유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이론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때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합리적일 수있다. KBO리그 구단 중 일부는 ‘노력도 하지 않고 돈을 가져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 만큼 가져가는 게 시장 이치에 맞다’는 논리로 통합마케팅을 반대한다.
메이저리그처럼 입장수익을 홈구장이 100% 가져가는 대신 일정비율을 적립해 스몰마켓 구단도 손해를 줄일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난색을 표하는 구단이 있다. 원정 티켓은 원정팀이 직접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관중수익 100%를 홈팀이 갖자’고 주장하는 팀이 들어줄리 없다. 이래저래 답이 보이지 않는 리그다.
zzang@sportsseoul.com




![박나래, 전현무 손잡고 복귀…무속 예능 ‘운명전쟁49’ 공개 [공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04/news-p.v1.20260204.160a3e3d108b4e728f813e13f3c1c51e_T1.png)


![박준현 학폭 논란, 결국 ‘법정 싸움’으로…그리고 피해자 측이 ‘걱정’하는 것 [SS포커스]](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04/news-p.v1.20260202.c194f0df39b64f4ca8a4f79ca5c22ad3_T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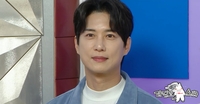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올림픽은 ‘찬밥’…JTBC 독점과 무지한 체육행정[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d0c372a5-4897-4f59-a2c2-b418e0a77ae9.jpeg)
![“캠프서 3000개는 던져야” 김성근·선동열의 재림, 트렌드라고? [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496a2f67-8246-4727-b4f6-fde5985b20cf.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장르의 새로운 공식…언어로 무대화한 매혹적인 퍼포먼스](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8/58867f53-7347-46d3-8e67-dd34b098c539.jpg)
![핸들을 놓거나, 혹은 잡거나…괌을 여행하는 두 가지 ‘속도’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507/e53f451a-06e2-4ba0-9e6a-b9d0a609af61.jpg)
![‘한화→대표팀’ 계속 시끌시끌…이제 김서현에 그만 ‘매몰’됩시다 [김동영의 시선]](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df89794b-229a-4cf7-92bc-5fafb2ea18fa.jpg)
![‘프로게이머’는 그만…이제 ‘프로 e스포츠 선수’라 부를 때다 [김민규의 e시각]](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88018f7a-a412-4750-b8ad-9f1915af98f2.jpg)
![부드러운 강력함, BMW 550e…고성능 PHEV의 정수[배우근의 생활형시승기]](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1/c8f23327-96f7-4d48-a157-3fba7f049636.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관객 참여형 뮤지컬 ‘리딩 쇼케이스’, 경쟁력 살아있네!](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12/792903aa-f247-4ab1-8fbc-7a78ba8619be.jpg)
![시험도 연애도 ‘실전은 기세야! 기세’ [함상범의 오답노트]](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2/e154397e-c160-4bb0-8471-ebe81efd4eb9.jpg)
![최초 2500세이브, 한국 핸드볼 골키퍼 레전드 삼척 박미라의 영구결번 ‘12’ [원성윤의 피봇플레이]](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3/1f8f4ff7-3e07-4005-a292-bfecedc9b8c9.jpg)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올림픽은 ‘찬밥’…JTBC 독점과 무지한 체육행정[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03/rcv.YNA.20260121.PYH2026012108400001300_T1.jpg)
![메달로 답했는데 ‘먹튀’ 낙인…中애국주의 논란에 억울한(?) 구아이링[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03/news-p.v1.20260203.3daf9cad310a4ab8a1761b57e14aa58b_T1.jpg)
![“캠프서 3000개는 던져야” 김성근·선동열의 재림, 트렌드라고? [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2/02/news-p.v1.20260202.2a9f62d448b94ba4b3ac95f4be31be2b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장르의 새로운 공식…언어로 무대화한 매혹적인 퍼포먼스](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9/news-p.v1.20260129.392a3c415d034578b35a3c4e390213ef_T1.jpg)
![렉서스 LM500h가 선사하는 ‘밤의 유영’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8/news-p.v1.20260128.bc81a1cc545947779711745c37dab4d5_T1.jpg)
![폭스바겐 투아렉과 엑소(EXO)의 ‘으르렁’, 도로를 지배하는 야수의 본능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8/news-p.v1.20260121.3b4916907bda408ca60bf314625fbe68_T1.jpg)
![미아 위기 FA 손아섭 최저연봉 3000만원 파격 역제안, 안되나?[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7/news-p.v1.20251101.e9d756e4c1434a3e815d1afe515c6837_T1.jpeg)
![“감각으로 가르치면 다 도망가요” 최강록 셰프 푸념, 어째 KBO리그 스프링캠프 같네 [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1/news-p.v1.20250302.c20de051663143b6b327ab83c1bf0068_T1.jpg)
![KBO 아마야구 ‘생태계 교란종’ 전락? 고교 선수 빼가거나 보내거나 [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9/news-p.v1.20260113.5cbe22767e0b4a9781d22b9e7ff82c08_T1.jpg)
![싼타페, 진중함 속에 숨겨진 ‘칼군무’ 같은 디테일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3/news-p.v1.20260117.73075b56ae8842c3954ce5189538f963_T1.jpg)
![설원 위 ‘첫사랑’ 같은 떨림…볼보 EX30 CC와 함께한 ‘Love 119’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26/news-p.v1.20260117.42f0d9b6b18944fdad628d610cc21e7b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은 ‘팬레터’…다시 찾아온 ‘봄의 노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5/news-p.v1.20260115.3f4fedafbbb042a28af204cbd8ef2300_T1.jpg)
![“난 앞만 보고 달려”…설원(雪原)을 찢는 두 개의 심장 ‘질주’, 람보르기니 우루스 SE [원성윤의 가요타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7/news-p.v1.20260114.ccef9acd8a3347cbb1e76f4ecda569fe_T1.jpg)
![다니엘의 ‘소통과 포석’…431억 소송前 첫 수읽기[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3/news-p.v1.20260113.ed0686c45f074955bfa3132066ef0e14_T1.jpg)
![핸들을 놓거나, 혹은 잡거나…괌을 여행하는 두 가지 ‘속도’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5/news-p.v1.20260110.5fc5660da4ef4a2e94b612ca7c576fd8_T1.jpg)
![우승의 익숙한 결말…도라도 2위는 ‘기량 아닌 구조’의 결과인가 [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08/news-p.v1.20260108.8c28c154735a4a5eb7c40570ca480194_T1.jpg)
![낮엔 스키·밤엔 불꽃·입안엔 딸기…비발디파크의 완벽한 하루 완성법③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0/news-p.v1.20260104.52019598f0714ce0bc77d65fc16e4c4f_T1.jpg)
![“아빠, 나 봐봐! 안 무서워”…스키와 승마로 배운 도전, 비발디파크의 겨울②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10/news-p.v1.20260104.16672b4755af4af0a75305dab49688d3_T1.jpg)
![단상 아래서 내민 손…스크린밖 안성기를 기억하며 [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05/news-p.v1.20260105.d5bd54db5a94482a8fd06ee1230cd3f0_T1.pn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악동 외톨이의 폭주 ‘비틀쥬스’, 스크린 찢고 나온 만물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6/01/05/news-p.v1.20260104.86b0547dfd5d48e3aad4930d75aba2fb_T1.jpg)


![[SS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legacy/2022/04/26/news/2022042601001378400100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