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삼성 ‘끝판대장’ 오승환(43)이 유니폼을 벗는다. ‘1982년생 황금세대’의 마지막 별이 진다. 이로써 리그 최고 ‘맏형’ 타이틀은 1983년생에게 간다. KIA 최형우(42)가 있다. 큰형이지만, 여전히 4번 타자로서 매섭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오승환의 은퇴는 단순한 개인의 작별이 아니다. 추신수, 이대호, 김태균, 정근우, 손승락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1982년생들이 하나둘씩 떠났다. 마침내 마지막 ‘전설’까지 물러난다. 굿바이 1982.
오승환과 삼성 시절 ‘왕조’를 함께 했던 최형우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은퇴 기사를 보고 조금 울컥했다”며 “(오)승환이 형도 그렇고, 다른 형들도 다들 할 만큼 했던 형들이다. 떠난다고 하니 슬펐다”고 했다.


그는 이제 KBO리그 최고령 현역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전으로 뛴다. “은퇴 시기를 정해두진 않았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매일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묻자, “적시타 쳐서 세이브 날린 일”이라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최형우는 2011년 오승환의 단일 시즌 아시아 세이브 신기록(47세이브) 도전 당시를 떠올렸다.
“승환이 형이 신기록까지 1개 남았는데 8회 3점차로 앞서고 있었다. 9회 형이 올라와 막았으면 신기록이었는데, 내가 8회 적시타를 쳤다. 세이브 요건이 안 됐고, 경기 끝나고 투수 형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혼났다”라며 웃었다.

‘전설’이다. 오승환이 써 내려간 꾸준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2006년과 2011년 47세이브로 당시 단일 시즌 최다 세이브 아시아 신기록을 썼다. 매시즌 30세이브는 기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프로야구(NPB)에서 80개, 메이저리그(ML)에서 42개 세이브 올렸다. 2021년 44세이브로 최고령 40세이브 및 구원왕 타이틀까지.
오승환의 뒤를 이을 후배를 물었다. 최형우는 “뛰어난 후배가 많지만, 승환이 형 같은 커리어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중간에 안 다쳐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한다. 20년 넘게 그걸 해낸 사람은 승환이 형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퇴 결정하기까지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다. 형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한·미·일을 돌며 20년 넘게 야구를 했다”며 “승환이 형, 그동안 너무 잘했고 진짜 고생 많았어!”라고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황금세대’는 은퇴했지만, KBO에는 여전히 최형우가 버티고 있다. 여전히 불방망이를 휘두른다. 은퇴가 아닌 도전의 언어로 그라운드를 채우고 있다. kmg@sportsseoul.com


![맹승지, 한 뼘 속옷 입고 몸매 자랑 “승지의 크리스마스” [★SNS]](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7/news-p.v1.20251207.98c269e39c2846fa8b5b218177dbb7be_T1.png)


![‘낯 뜨거운 시상 순간’ 심판상 받는데 돌아온 건 격한 야유뿐…땅에 떨어진 K-심판의 권위와 신뢰[SS현장]](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6/news-p.v1.20251206.f17c1c5e4e814adfbb171c94b855e02f_T1.jpeg)
![‘은퇴’ 조진웅이 또…폭행+음주운전 논란에 “확인중” [공식입장]](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8/news-p.v1.20251206.ca6bd20207c54541be76c625b3bb6ea4_T1.jpg)



![‘FA 총 57억’ KIA, 애초에 6명 다 잡기 어려웠다…마지막 조상우는? [SS시선집중]](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7/news-p.v1.20251207.9b5b2f4bcb4141aa8be27d178180659f_T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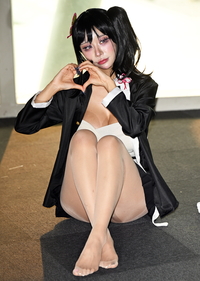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라이프 오브 파이’, 수식어는 거들 뿐!…경험한 자만 아는 경이로움](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8/58867f53-7347-46d3-8e67-dd34b098c539.jpg)
![배우 조진웅,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d0c372a5-4897-4f59-a2c2-b418e0a77ae9.jpeg)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 “검은 흙먼지 걷고 ‘2.5조 빅뱅’ 쏘다”…강원랜드, 오사카 넘을 ‘K-리조트’의 대반격](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507/e53f451a-06e2-4ba0-9e6a-b9d0a609af61.jpg)
![검사(檢査) 받는 KBO, 이 참에 정치-스포츠 절연해야[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496a2f67-8246-4727-b4f6-fde5985b20cf.jpg)
![‘한화→대표팀’ 계속 시끌시끌…이제 김서현에 그만 ‘매몰’됩시다 [김동영의 시선]](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df89794b-229a-4cf7-92bc-5fafb2ea18fa.jpg)
![‘프로게이머’는 그만…이제 ‘프로 e스포츠 선수’라 부를 때다 [김민규의 e시각]](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88018f7a-a412-4750-b8ad-9f1915af98f2.jpg)
![메이저리거 김하성, 올리브 패딩으로 완성한 겨울 스트릿 룩! [이주상의 e파인더]](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503/fe6a08ea-7f72-4cdb-a416-b9c23cacb661.jpg)
![부드러운 강력함, BMW 550e…고성능 PHEV의 정수[배우근의 생활형시승기]](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1/c8f23327-96f7-4d48-a157-3fba7f049636.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관객 참여형 뮤지컬 ‘리딩 쇼케이스’, 경쟁력 살아있네!](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12/792903aa-f247-4ab1-8fbc-7a78ba8619be.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라이프 오브 파이’, 수식어는 거들 뿐!…경험한 자만 아는 경이로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9/news-p.v1.20251209.210b05ad14b24049a9ae565cdc426f31_T1.jpg)
![배우 조진웅,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7/news-p.v1.20251207.6ee3b4b2f0ac41d297a6388d2551fe78_T1.png)
![서울大 경영 택한 이부진 아들…이상한건 한국의 ‘의대집착’[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5/rcv.YNA.20231113.PYH2023111304990001300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 희생으로 완성한 역사…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1/news-p.v1.20251201.153ccb2b098b41ba80ab8b1deafd2b7b_T1.jpg)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 “검은 흙먼지 걷고 ‘2.5조 빅뱅’ 쏘다”…강원랜드, 오사카 넘을 ‘K-리조트’의 대반격](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2/02/news-p.v1.20251127.97ad4e79fd2d4eca9e7ebdc7918bb8b8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뮤지컬 ‘에비타’, 아르헨티나가 여전히 그리워하는 ‘민중의 성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23/news-p.v1.20251123.203766df5b7e4a7f9a527eb1f6c17dfe_T1.jpg)
![김연경 프로젝트, 예능 넘어 배구계 향한 승부수 [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8/news-p.v1.20250924.517fd1fa8f6541a8ad2a1eec07bb813d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산타클로스 선물 같은 뮤지컬 ‘렌트’, 사랑한다면 지금 고백하세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7/news-p.v1.20251117.f21bdbe93fe148c5995a3f38d2a0b60a_T1.jpeg)
![검사(檢査) 받는 KBO, 이 참에 정치-스포츠 절연해야[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3/news-p.v1.20250728.f9bb242e2c82472fa8d612505912c2dc_T1.jpg)
![‘한화→대표팀’ 계속 시끌시끌…이제 김서현에 그만 ‘매몰’됩시다 [김동영의 시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2/news-p.v1.20251109.4ae0b9b222f643318113e0a44330694a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연극‘아마데우스’, 아름다움을 시기·질투 그리고 탐욕스러운 대가…그 끝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2/news-p.v1.20251112.8877cc152a7840e98ba4dd0a2af8917c_T1.jpg)
![‘프로게이머’는 그만…이제 ‘프로 e스포츠 선수’라 부를 때다 [김민규의 e시각]](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1/news-p.v1.20251110.4e944a9ed7b6439a8f6520d6aadba4f6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뉴 캐스트의 발견 뮤지컬 ‘데스노트’, 21세기 ‘선악과의 유혹’이 시작된다](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10/news-p.v1.20251110.567bb0e84eb8420c882e267580557d3d_T1.jpg)
![‘뉴진스는 어디에’…올드진스 되어가는 다섯소녀의 잃어버린 시간 [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09/news-p.v1.20250110.3ea142b2edd04106acbab760db7b2fa0_T1.jpg)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418홈런 타자, ‘코치 해줘서’ 고맙습니다 [김동영의 시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05/news-p.v1.20240529.776d1202158b4b339a1f70fad8e3d720_T1.jpg)
![문가비子 사진공개, 갑론을박할 문제인가?…댓글 OFF 전환[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03/news-p.v1.20251102.49b9e2ca456748bf8faf32bae4427aad_T1.jpg)
![메이저리거 김하성, 올리브 패딩으로 완성한 겨울 스트릿 룩! [이주상의 e파인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1/03/news-p.v1.20251101.3aa8b5ac67c34f12a09d494d86ad5ce5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사랑은 ‘날씨’처럼 변하는 것…뮤지컬 ‘레드북’, 나를 찾는 탐험 같은 ‘어른이 동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31/news-p.v1.20251031.fc8162ee336d4f2087ea7b7354537b26_T1.jpg)
![세 번의 비행, 한 번의 보트…고단함 끝에 만난 어른들의 낙원, 로빈슨 클럽 몰디브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29/news-p.v1.20251019.ffed48b43e9741e09e5b1158d87b4b60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한시도 눈 뗄 수 없는 다이내믹 체인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27/news-p.v1.20251027.362d1b48c56e441f94baff25034eb235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