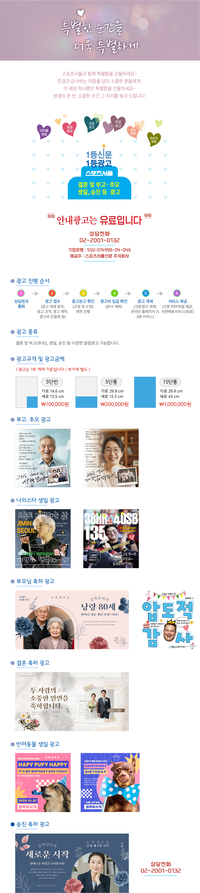[스포츠서울 | 정의정 웰니스전문위원]
① 기술은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불행한가
오전 7시, 스마트폰 알람과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눈을 뜨기도 전에 카카오톡 100개, 이메일 50통이 쌓여 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선 넷플릭스, 회사에선 줌 미팅, 점심엔 유튜브 쇼츠를 보며 배달음식, 퇴근 후엔 쿠팡에서 ‘나를 위한 선물’을 산다. 잠들기 전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 문득 생각한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다. AI가 질문에 답하고,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 물건을 주문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기술은 날마다 발전하는데, 우리 마음은 왜 이토록 공허할까.

풍요 속의 결핍, 성공 속의 공허
통계는 냉정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청년 행복지수 최하위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54%가 번아웃을 경험했고, 우울증 유병률은 10년 사이 2배 증가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풍요 속의 결핍, 성공 속의 공허, 연결 속의 고립.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실존적 역설이다.
2020년 코로나19는 세상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가 ‘바쁘게’ 살았지, ‘온전히’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 이후 ‘정신적 건강 위기’를 전 지구적 과제로 선포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인류는 이제 새로운 질문 앞에 섰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의 중심에 웰니스(Wellness)가 있다.
웰니스는 사치가 아닌 생존이다
많은 이들이 웰니스를 ‘부자들의 여가’, ‘비싼 스파와 요가’로 오해한다. 그러나 WHO가 정의하는 웰니스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지향하는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이다. 즉, 웰니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소비가 아니라 실천이다.

웰니스는 신체·정신·정서·사회·영적·환경적 차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들고, 관계가 깨지면 삶의 의미도 흔들린다. 웰니스는 행복의 과학이 아니라 존재의 철학이다.
AI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은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진정 나답게 살고 있는가?”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존재 이유를 대신할 수는 없다. 웰니스는 바로 이 ‘존재의 공백’을 채우는 여정이다.
K-Wellness, 세계를 선도하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전 세계 웰니스 시장은 2024년 기준 6.8조 달러(약 9,00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의미다. 웰니스 산업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치’를 원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다.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사람들은 웰니스를 선택한다.

대한민국은 웰니스 산업의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수천 년 이어온 한방 의학, 명상 전통,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철학에 K-뷰티, K-푸드, K-컬처가 더해지며 한국은 이미 웰니스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웰니스협회(IWA)는 올해 스포츠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웰니스 브랜드 대상’을 공동 주관한다. 이 상은 존재 중심의 브랜드 철학을 공론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웰니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자리가 될것이다. 기술의 시대에서 존재의 시대로. 웰니스는 인류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서는 것,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다.
이러한 취지로 ‘대한민국 웰니스 브랜드 대상’이 기획되었고, 웰니스를 통한 국민의 삶, 기업의 가치가 제고되도록 공동기획 컬럼을 시리즈 기회하여 소통하려고 한다. dorrit@naver.com


![이재명 대통령 출연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 하루 연기 [종합]](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05/news-p.v1.20251003.a50ecb75be794a09bf96cc603663ecf4_T1.jpg)
![헤어 디자이너 잘 바꿨네…송지아, 연예인 수준 눈부신 미모 [★SNS]](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05/news-p.v1.20251005.adc686fa9f404de9ac3fc9f23cd30499_T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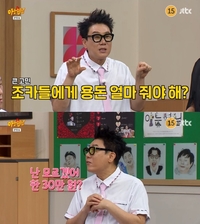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만병통치 힐링 뮤지컬 ‘아몬드’, 사랑·관심이 불러온 나비효과](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8/58867f53-7347-46d3-8e67-dd34b098c539.jpg)
![영혼은 성지에서 쉬고, 미식은 자연에서 채운다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507/e53f451a-06e2-4ba0-9e6a-b9d0a609af61.jpg)
![추성훈發 ‘축의금 논쟁’, 단순한 돈 문제 아니다[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d0c372a5-4897-4f59-a2c2-b418e0a77ae9.jpeg)
![‘실물 1등 아이돌’ NCT 정우, 브래드 피트가 울고 갈 얼굴!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503/fe6a08ea-7f72-4cdb-a416-b9c23cacb661.jpg)
![원칙 어겨가며 WBC 대비 시작, ‘국대 성공’ 최대 수혜자 누구일까?[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496a2f67-8246-4727-b4f6-fde5985b20cf.jpg)
![2년 연속 ‘1000만 관중’ 흥행 대폭발, 선수와 팬에게 드리는 ‘당부’ [김동영의 시선]](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03/df89794b-229a-4cf7-92bc-5fafb2ea18fa.jpg)
![부드러운 강력함, BMW 550e…고성능 PHEV의 정수[배우근의 생활형시승기]](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1/c8f23327-96f7-4d48-a157-3fba7f049636.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관객 참여형 뮤지컬 ‘리딩 쇼케이스’, 경쟁력 살아있네!](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312/792903aa-f247-4ab1-8fbc-7a78ba8619be.jpg)
![시험도 연애도 ‘실전은 기세야! 기세’ [함상범의 오답노트]](https://file.sportsseoul.com/svc/columnist/202402/e154397e-c160-4bb0-8471-ebe81efd4eb9.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만병통치 힐링 뮤지컬 ‘아몬드’, 사랑·관심이 불러온 나비효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06/news-p.v1.20250930.217021d4219e4ae7a7d3681f26ac0a8e_T1.jpg)
![추성훈發 ‘축의금 논쟁’, 단순한 돈 문제 아니다[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30/news-p.v1.20250204.a7bdaa6634af49d8890a71f102f7b57b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어느 추운 겨울 세 남자의 혁명…뮤지컬 ‘데카브리’, 암흑기 바꾼 위로와 용서](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29/news-p.v1.20250929.b3f0115bf3e441e4a8c166b7602b61bc_T1.jpg)
![영혼은 성지에서 쉬고, 미식은 자연에서 채운다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06/news-p.v1.20250926.1a7f8a2ae73042e7b08faaad8bec86ae_T1.jpg)
![‘실물 1등 아이돌’ NCT 정우, 브래드 피트가 울고 갈 얼굴!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25/news-p.v1.20250925.3cfe70a93be54a07ba745ec56e0288c3_T1.jpg)
![‘최강미모’ 카리나가 공항에서 팬들에게 선물한 것은? 푸른 하늘! [이주상의 e파인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27/news-p.v1.20250924.3dcdf4271a404fe89f09f1740e443ffc_T1.jpg)
![‘케데헌’ 혼문의 판타지, 에버랜드에서 펼쳐진다…벌써부터 흥행 예감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06/news-p.v1.20250923.64f3d7821a6d4033a95e4ef567d4d575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전하지 못한 진심 뮤지컬 ‘쉐도우’, 263년 지난 ‘미래’서 완성](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22/news-p.v1.20250922.49c81f613f0544d8b66244baced87f5c_T1.jpg)
![‘귀여운 배우’ 박규영의 공항패션 콘셉트는? 캐쥬얼이 어울리는 귀여운 여인! [이주상의 e파인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21/news-p.v1.20250921.7ddd5e9874824bd08fe6d6772481fc7e_T1.jpg)
![연산군, ‘明사신과 나란히 상석, 고개도 숙였다’…폭군의 셰프, 불편한 장면들[배우근의 롤리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19/news-p.v1.20250918.3179195093ac41d79d37752baaa56553_T1.png)
![인천공항 충격 빠트린 문가영 패션…어깨선 드러난 블랙 레이스 란제리룩! [이주상의 e파인더]](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20/news-p.v1.20250917.fe6beb8bafe34c9f8222fe9c69fab905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눈치 안 보고 맘껏 울어도 되는 연극 ‘나의 아저씨’, 인생 숙제를 끝낸 울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14/news-p.v1.20250914.99e368319c0f45939ef382e1d410d7cc_T1.jpg)
![노들섬에 노을이 지자, 음악이 울려퍼졌다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06/news-p.v1.20250907.2ee5f12f461d472ba7a664b3aabc7f84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사랑을 갈구하는 애절한 절규…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찬란한 대작의 위엄](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8/news-p.v1.20250908.f0da5133ee6d40f7b565446823837083_T1.jpeg)
![원칙 어겨가며 WBC 대비 시작, ‘국대 성공’ 최대 수혜자 누구일까?[장강훈의 액션피치]](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e1cb9b290fb74611b3b1690d8348633f_T1.jpg)
![심신의 회복, 태교 여행로 입소문 난 파크로쉬…한국 웰니스 톱티어라 불리는 이유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06/news-p.v1.20250901.ed804a8cbe0e442f98e78af6c89afa30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지금 이 순간’ 잇는 축가 탄생…왜 ‘위대한 개츠비’를 부르는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1/news-p.v1.20250901.ad4f9b7b83f34e7fb71744d45026de94_T1.jpg)
![사색하는 메덩골정원, 이곳에서 철학이 시작된다 [원성윤의 인생은 여행처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10/06/news-p.v1.20250825.05212c809cb54b2e9f87ccda8cf346ca_T1.jpg)
![[표권향의 컬처판타지아] 로큰롤에 제대로 美친 ‘4인 4색’ 매력…뮤지컬 ‘멤피스’, 셔터 올라간다 “에브리바디, 하카두!”](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5/news-p.v1.20250825.d2028c8052e64f929e2df0fbce63b1bf_T1.jpg)
![2년 연속 ‘1000만 관중’ 흥행 대폭발, 선수와 팬에게 드리는 ‘당부’ [김동영의 시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4/rcv.YNA.20250823.PYH2025082306120001300_T1.jpg)
![[동정]김홍배 전 스포츠서울 출판기획팀 국장, 큰아들 결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5/06/news-p.v1.20250506.8de009e4b1c84296a5d99cd5c9e52da8_T1.jpg)
![[스포츠서울 알림광고]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결혼, 부고, 추모, 생일, 승진, 축하광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4/25/news-p.v1.20250424.4b7adbcab24a42c6bd1eaf8f6f304435_T1.jpg)